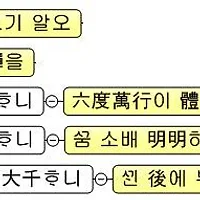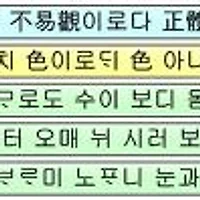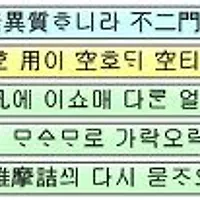아비규환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 인용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헌재로 진입을 시도, 이를 막는 경찰들과 대치를 벌이고 있다.
아비규환(阿鼻叫喚)
1 . <불교>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신문의 기사, 아비규환이란 제목 아래, 저런 사진을 건다. 아비규환, 흔한 말이다. 이 말로 이미지를 찾아 보면 갖가지 지옥 그림이나, 큰 참상의 그림이 뜬다. 지옥의 상상도 동서고금에 흔한 상상이다. 동서고금에 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가현각은 대뜸 '찰나에 아비업을 없게 하나니'라고 노래한다. 불교에서 지옥은 윤회의 한 부분이다. 아비지옥은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모질고 무거운 지옥이다. 그런 지옥도 찰나에 없게 할 수 있다면, 윤회도 찰나에 없게 할 수 있다. 사람도 없고, 법도 없다니, 뭐 더 따질 까닭도 없겠다.
찰나(刹那)는 힘 센 사람이 연(蓮) 줄기의 실을 끊을 사이라.
아비(阿鼻)는 범어(梵語)이니, 예셔 이르기는 ‘사이 없음’이다. 죄(罪) 입음이 ‘사이 그침 없을시니’, 지극(至極)히 중(重)한 지옥(地獄)이라.
이 풀이는 『증도가사실』의 풀이를 따서 우리말로 새겼다. 『증도가사실』의 풀이는 더 길지만, 필요한 부분만 줄여서 인용한다. 역사(力士)라는 말은 '힘 센 사람'이라고 새긴다. 연 줄기의 실은 아주 가늘다. 아주 가는 실을 아주 힘이 센 사람이 끊는다. '끊다'라는 동작의 앞과 뒤, 그 사이를 뽑아서 찰나라고 이름했다. 아주 가는 실과 아주 힘 센 사람, 그래서 아주 짧은 사이가 된다. 시간은 동작과 동작의 사이이다. 아비지옥은 무간지옥이라고도 부른다. 무간(無間)은 '사이 없음'이라고 새긴다. 수죄(受罪)는 '죄(罪) 입음'이라고 새긴다. 간단(間斷)은 '사이 그침'이라고 새긴다. 찰나의 사이도 없이, 쉼도 없이 몸을 괴롭힌다.
업(業)은 일이니, 이든 일 지으면 이든 데 가고, 모진 일 지으면 모진 데 가느니라.
업(業)은 일이니, 제 지은 일이 좋으면 좋은 데 가고, 궂으면 궂은 데 가느니라.
아비규환, 지옥은 '모진 데'이고 '궂은 데'이다. 악처(惡處)를 새긴 말이다. 똑 같은 한문 구절, 위의 구절은 『증도가』의 번역이고, 아래 구절은 『금강경삼가해』의 번역이다. 선(善)과 악(惡)도 대구이다. 때로는 '읻다-모질다'의 짝으로 새긴다. 때로는 '좋다-궂다'의 짝으로 새긴다. 언해의 풀이, 짧아도 말 하나마다 제 사연이 있다. 업(業)이란 글자, 범어, 인도말을 한자로 번역한 글자이다. 카르마(karma)를 갈마(羯磨)라고 적고, 업(業)이라고 새겼다. 그리고 사(事), 또는 사업(事業)이라고 풀이했다. 언해불전은 모두 '일'이라고 새긴다. 동사로 읽을 때는 '짓다'가 된다. 찰나는 일 또는 '짓다'의 사이이다. 시간(時間)이란 말에도 간(間), 사이가 들어 있다. 일로부터 그 '사이' 만을 추상(抽象), '뽑아 내어' 부르는 이름이다. 일과 일 사이를 가르고 금을 긋는 일이다.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짓이다.
언해불전의 우리말투도 인도말과 중국말 사이에 서 있다. 새로 만든 글자로 할 수 있는 일, 인도말과 중국말 사이에서, 늘 쓰던 한자말과 우리말을 반성한다. 언해불전의 우리말투, 나는 '실험'이라고 부른다. '세종의 실험'이라고도 부른다. 인도말과 중국말 사이에서 우리말을 실험한다. 언해불전에는 숱한 실험의 사례들이 담겨 있다. 인도의 말, 중국의 말, 오래 된 아시아의 상상과 사유의 조각 들이다. 아직은 그냥 조각들이다. 조각들 사이에 길이 있다. 조각을 모으면 상상이 되고 사상이 된다. 우리말과 우리 글자,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길이다.
'세종과 함께 읽는 > 道를 證한 노래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16_01 노래의 마디 (0) | 2018.09.16 |
|---|---|
| 014_01 게여운 거짓말 (0) | 2018.09.07 |
| 045_한 낱 두려운 빛이, 색(色)이로되 색(色) 아니니 (0) | 2018.09.05 |
| 044_여섯 가지 신(神)한 용(用)이 (0) | 2018.09.05 |
| 043_여래장 속에서 친히 얻을지니 (0) | 201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