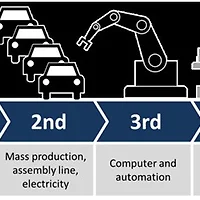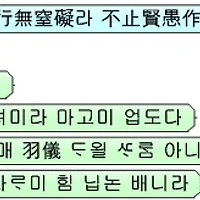나맟은 주머니의 옛말이다. 15세기에 나맟과 주머니 그리고 자루는 비슷한 말이다. 크기와 모양은 좀 달라도, 요즘의 눈으로 보자면 대강 자루에 가깝다. 나맟이란 게 뭔가? 뭔가를 담는 그릇이다. 뭘 담을까? 남은 것이다. 표범은 먹고 남은 것을 나무에 걸쳐 둔다. 다람쥐는 남은 도토리를 돌 틈에 땅 속에 나누어 감춘다. 그런 자리가 그들의 나맟이다. ‘한 것’은 일물(一物), 한 물건이다. 나맟에 한 물건도 없다. 텅 비었다. 나맟이 비었다면 끼니를 찾아 나서야 한다. 꾸물거릴 틈이 없다. 목숨이 걸렸다. 편할 리가 없다.
청춘(靑春)을 ‘퍼런 봄’이라고 새긴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두시언해』에서는 ‘푸른 봄’이라고 새긴다. 퍼런 봄과 푸른 봄, 말이 다르면 느낌도 다르다. 나맟이 비어서 그랬을까, 퍼런 봄은 뭔가 슬프고 불안하다. 퍼런 봄이면 으레 나맟이 비게 마련이다. 갈무리 해 두었던 것으로 한 겨울을 났다. 퍼렇게 싹은 올라오지만 그걸로는 배를 채울 수도 없고, 나맟을 채울 수도 없다.
부혐천구소(富嫌千口少)하고 빈한일신다(貧恨一身多)ᅵ니라
가면 이는 천 입이 적음을 츠기 여기고
가난한 이는 한 몸이 함을 애와티니라
이런 기막힌 노래도 있다. 퍼런 봄의 노래는 이어진다. 다. 천년 전의 노래를 오백 년 전에 저렇게 우리말로 옮겼다. 가멸다와 가난하다, 얼굴과 대가리가 대구로 쓰이듯, 빈부(貧富)도 대구로 쓰인다. 언해불전은 '가멸다 – 가난하다'의 대구로 새긴다. ‘츠기’는 ‘측은히’의 옛말이다. 한(恨)은 '애와티다'라고 새긴다.
탄핵의 겨울, 청문회를 드나들던 숱한 사람들, 그들의 얼굴대가리를 보고 들으며, 저 노래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천 개의 입은 천 명의 사람이다. 천 명의 사람을 소유하고 부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도 제 처지를 츠기 여긴다. 가진 게 너무 적기 때문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적은 처지가 싫고 밉다. 청문회의 사람들, 그들은 대개 서울하고도 강남에 산다. 나라에서도 손꼽는 부자들이다. 그런 이들이 스스로를 가여워 안절부절, 거짓말도 하고 다투기도 한다. 너절해 보여도 그 순간만 넘기면 그만이다. 금새 당당해진다. 그래도 그들은 가멸다. 화면에 비치는 그들만의 측은함, 그들만의 슬픔, 가난한 이들이야 어찌 알까? 입도 없는 것들, 제 몸 하나도 너무 많다고 애와틴다. 그래 봐야 제 사정이다.
꿈 같고 뜬 구름 같아 사롤 혬이 다 없어 육친(六親)이 끊어졌네
노래는 이렇게 이어진다. 활계(活計)를 ‘사롤 혬’이라고 새긴다. ‘살혬’이다. 살아가야 할 혬, 셈이고 헤아림이다. 육친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이다. 제 몸 하나도 너무 많아 가눌 수 없는 가난한 이의 처지, 나맟이 비면 가족도 망가진다. 천륜이라지만 하늘도 무너진다. 옛날 노래가 아니다. 꿈같고 뜬 구름같고, 그래도 퍼런 봄은 속절없이 오고 간다.
갓나맟에 똥을 담았으며 고름과 피의 모둠이라, 밖에 향을 바르더라도 안은 오직 냄새 나며 더럽다. 좋지 않은 게 흘러 넘쳐 구더기 있는 땅이라. 고기 파는 저자와 뒷간의 구멍도 이에 미치지 못하리라.
나맟의 노래는 갓나맟으로 이어진다. 가죽으로 만든 나맟이다. 똥이 담겼고, 고름과 피가 담겼다. 언해불전에서 나맟은 몸을 비유한다. 갓나맟, 가죽주머니는 말하자면 강조나 과장이다. 사람의 가죽과 살을 앞세운다. 갖나맟은 사람의 대가리이다. 피와 고름과 똥의 모둠, 가죽 안에 그런 게 담겼다. 이건 갓나맟의 믿얼굴이다. 대가리에 아무리 좋은 향을 발라도 안은 오직 더러울 뿐이다. 주사가 되었건 수술이 되었건 낯에 집착하던 대통령, 그를 바로 탓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 사이 아기의 탯줄에서 모은 피로 주사를 만들어 맞았다는 이들 이야기도 나왔다. 갓나맟과 대가리, 그걸 위해 별짓을 다한다. 흡혈귀, 뱀파이어가 따로 없다.
'월인천강, 평등과 자유의 열쇠 > 말의 얼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3 빈대가리 쪼지 마라 (1) | 2018.04.20 |
|---|---|
| 1.6 한쪽으로 흐르는 냇보람 (0) | 2018.04.15 |
| 1.4 미스 하라웨이의 얼굴대가리 (0) | 2018.04.13 |
| 1.9 어린이와 어진이 (0) | 2018.04.13 |
| 1.8 아롬을 잡는 그릇 (0) | 2018.04.12 |